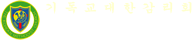변종호가 이용도를 만나다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pocmc 작성일17-08-16 12:24 조회4,8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5회나 설교를 하는데 서부교회 오후에는 역시 통역을 세웠다. 주의 일하심은 오묘타 할 수밖에 없다. 아무 설명할 말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기이한 것을 보여 주시도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도 신기하거니와 앞으로는 더욱더 기이한 것을 보여 주시리로다. 오 나의 영혼아, 고요히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자.
1931년 3월 1일 (일)
재령 집회 12일째 아침. '이용도'라는 이름에 늘 붙어 다니는 변종호란 인물이 이용도를 처음 만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 변종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용도와 연을 맺게 되는지 그 자신의 말을 들어보자.
9년간의 병상생활이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고 그 9년 동안에 받은 신체의 고통과 마음의 쓰라림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바가 많다.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에 내리는 서리도 분수가 있지 겨우 19세란 어린 몸에 길게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중병을 주어 9년이란 긴 세월을 '눈뱅이' 생활을 하는 형편을 당한다면 아무리 위인이고 위대한 신앙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감사란 말은 나오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본래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믿지 않은 죗값이라 할지 모르겠고,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입을 열어 중얼거릴 말도 없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예배당엘 다녔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일은 모두 다 하기를 염원해 오던 몸에 천벌 중에도 가장 심한 천벌을 받게 되니 하늘을 원망치 않을 수 없고 세상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을 복으로 여기어 기쁘게 받고 병상을 낙원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뻔뻔스러운 목사님은 피눈물 나는 중병이나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죽을병을 한번도 앓아 본 적이 없는 볼에 살이 피둥피둥 찐 사람이었다. 의인 욥도 어려운 고난과 병이 부딪혔을 때 "내 어머니의 태가 왜 나를 낳았으며 내 어머니의 젖이 왜 나를 길렀는가" 하고 탄식한 것을 생각한다면 나 같은 범속한 박신자(薄信者)가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요, 세상을 향해 원통하다고 발버둥친 것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된다.
병상에 누워 온갖 소망이 다 끊기고 반듯하게 누워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을 생각해보곤 하였다. 다섯 여섯 살 때 졸리는 눈을 비비며 아버지와 형의 손에 붙들려 예배당에 따라가던 눈 오던 추운 겨울밤도 생각났다. 열 살 안팎의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뛰어 놀다가 얄미운 애를 때리면 아버지가 나와서 나를 때려주며 야단치기 때문에 얄미운 그 애를 때려주지 못해 분해서 앙앙 울던 생각도 났다. 15~16세를 지나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을 때는 '사회를 위하여…' 또는 '집안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던 때도 기억되었다. 마음속으로나마 그렇게 알뜰히 생각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속을 썩이고 애쓰게 하던 과거가 생각났다. 그러자 지금 내 모습이 언뜻 생각되었다. 나는 부르짖었다.
"교회는 다 무엇이고 목사는 또 뭐냐. 있으면 다 나오라. 너희들과 한번 크게 싸우고 주를 향해 큰소리로 울려고 한다."
이런 발악의 병상 생활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몸이 쏘고 아픈 것, 온 세상에서 아주 버림을 받을 끝없는 고독, 죽이나 밥을 끓여먹을 쌀이 떨어진 일, 이 모두가 기막힌 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감사할 대상이 없는 심령의 고통은 참으로 유황불이 붙는 지옥의 고통에 못지않은 혹심한 것이었다. 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몸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어느 신령하다는 목사는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나의 깨끗한 방에 구두를 신은 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코웃음 쳐 돌려보내고서 나는 목사라는 거룩한 기생물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병이 차도가 있고 원기를 좀 회복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 그다지 호감을 갖지 않고 교역자들을 별로 대수롭게 보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1929년 겨울, 9년의 병상에서 일어나 대지에 발걸음을 딛게 된 때부터 점점 원기를 회복하여 넓은 인간 세상에 다시 나서기는 했지만 1931년 봄이 되기까지 2년 여 동안 예배당에 간 것은 단 두세 번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드리려고 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에나 갔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였다. 될 수만 있으면 교회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예배당에도 일절 발길을 안 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끝마치리라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